핫이슈
시정영상
포천 쌀 한 봉지의 행복한 밥상
2019-01-07 조회수 : 2990
포천에서 드넓은 평야를 볼 수 있는 곳이 관인이다. 철원 평야와 맞닿아 산이 많은 포천의 다른 곳과는 드물게 너른 들녘을 볼 수 있다. 거기에 한반도 중심에서 흐르는 한탄강이 있어 예로부터 쌀농사를 많이 지었다. 들판에서 익어가는 곡식이 주는 한없는 풍요로움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다.
관인면 장독대 마을의 지인이 오랜만에 방문한 나에게 이곳의 특산물인 쌀을 선물해 주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쌀 한 봉지였지만, 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마음처럼 깊은 속내를 알기에 고마웠다. 서둘러 집에 가서 귀한 쌀로 고슬고슬한 밥을 지어 먹고 싶었다.

ⓒ시민기자 이정식
먹을 것들이 많아 쌀 소비가 줄었다지만, 갓 지은 쌀밥처럼 따뜻하면서 든든하고 정감 어린 음식이 또 없다. 또 적당히 씻고 물을 맞추어 전기밥통의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밥을 짓는다. 그러다 보니 누룽지도 숭늉도 나오지 않는다. 그야말로 자로 잰 듯 반듯한 규격으로 인간미가 떨어지는 공장형 음식처럼 느껴진다. 오늘만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좀 번거롭고 실패확률도 높았지만, 옛날처럼 냄비에 밥을 짓기로 했다.
낯선 방식을 동원할 때는 아는 지식과 정보를 총동원해야 한다. 삼층밥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이 귀한 쌀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고 나름의 기억을 되살려 쌀을 씻고 냄비를 불 위에 얹었다.

ⓒ시민기자 이정식
‘아, 이거 아닌데…….’
불에 올린 지 얼마 안 되어 뚜껑이 날아가 버릴 듯 부르르 냄비가 떨린다. 걱정됐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전진뿐이다. 30여 분 밥을 짓기 위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른 끝에 드디어 뽀얗고 김이 솔솔 나는 갓 지은 밥을 얻을 수 있었다. 누구나 하는 밥 짓는 일이지만, 눈물이 날 뻔했다.

ⓒ시민기자 이정식
아내가 좋아하는 누룽지와 숭늉까지 만들어 밥상에 올리니 제법 그럴싸하다. 관인에서 생산한 쌀이라 그런지 쫀득한 찰기가 훨씬 더 하고 단맛도 강하게 느껴진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포천의 쌀로 만든 밥은 식욕을 마구 불러일으켰다. 잘 익은 김치와 함께하니 산해진미가 필요 없다. 몸과 마음을 살리는 우리네 소울 푸드다. 관인의 쌀 한 봉지가 가져다준 행복한 저녁 밥상이다.
시민기자 이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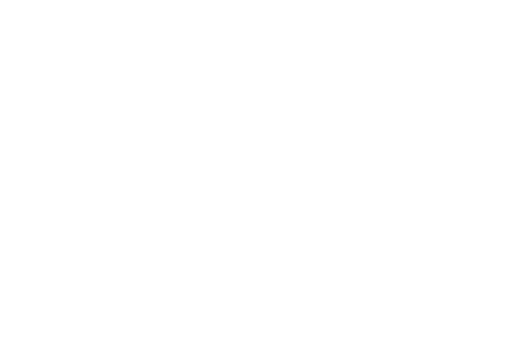
![[옛 포천을 거닐다 2편] 백사 이항복 선생의 얼과 영혼이 깃든 화산서원](/images/newshome/2020/img_blank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