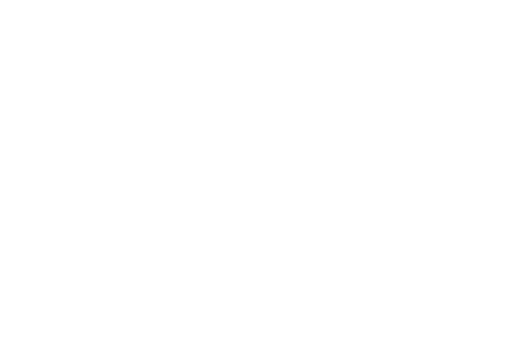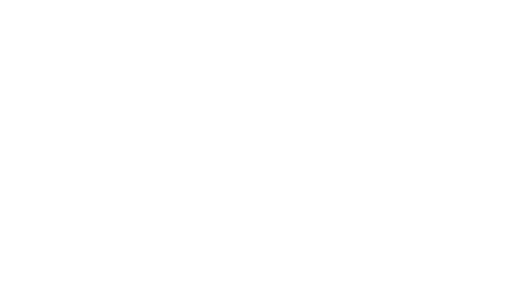핫이슈
시정영상
시민에세이
- 홈
- 참여마당
- 시민에세이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2011-12-30 조회수 : 4611
(김대환 선단동)
주말 아침, 조깅을 하려고 가벼운 추리닝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나섰다. 저녁 굶은 시할머니 얼굴처럼 잔뜩 찌푸렸던 어젯밤의 하늘은 아침이 되자 역시 가을하늘답게 눈이 부실 정도로 파랗다. 가지고 나간 생수 한 모금을 마시며 가쁜 숨을 달랬다. 노폐물이 빠져나간 몸은 하늘이라도 오를 듯 가볍다.
가볍게 몸을 풀며 되돌아오는 길에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 잠시 서서 배드민턴을 치는 노인들이 보였다. 할아버지·할머니들의 몸짓은 젊은이들보다 더 활기차다. 매일 보는 풍경이지만 볼 때마다 노인들의 그런 건강이 부럽다. 몇몇 할머니들은 운동보다는 나들이에 어울릴 정도로 곱게 차려 입었다. 소녀들처럼 깔깔 웃으며 대화를 나눈다. 나도 모르게 미소 한 가닥이 입가에 걸린다.
하지만 집 근처에 다달아 주택가 골목을 돌다 보니 저만치서 빈 박스를 모으는 할머니가 보였다. 몹시 허탈한 표정으로 망연하게 서 있었다. 모아두었던 박스들이 물에 젖은 모양이다. 젖은 박스는 상품가치도 떨어질 뿐더러 무게가 보통이 아닐 터이다. 할머니의 어두운 표정과 조금 전 보았던 밝은 얼굴들이 교차됐다.

문득 ‘9988124’란 말이 떠올랐다. 얼마 전 ……. 저녁 식사 중에 어머니가 물으셨다.
“아범아…….9988124가 뭔지 아니?”
뜬금없이 요상 야릇한 숫자퀴즈를 내시는 어머니 얼굴을 보며 “글쎄요, 998-8214……. 혹시 누구네 전화번호 아니에요?” 하며 답을 내자 어머니는 씨익~~ 웃으시며 “오늘 할머니들하고 모여서 놀다가 들은 숫자인데…….요즘 할머니들 사이에 유행하는 숫자란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 하자 어머니는 “99살 까지 88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죽는 거란다”
“큭~~”하고 웃음이 튀어 나왔지만 가슴 한편에는 진득한 아픔이 묻어 나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죽음이고, 아프지 않고 죽는 것이 두 번째 행복한 죽음이고, 죽는 것 보다 힘들게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불행한 죽음이라고 했는데 과연 나의 부모님과, 앞으로의 나와 내 아내는?? 그래서 9988124는 건강하게 오래 살다 병치레 길게 하지 않고 깔끔하게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모든 어르신들의 소망을 함축한 말일게다.
하지만 이것도 그야말로 ‘먹고 살만한 가운데’ 99세를 살아야 좋은 거지, 골목길에서 만난 할머니처럼 힘겹게 팔십, 구십을 산들 그 여생이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다시 ‘명(命)88124’라는 새로운 조어가 떠올랐다. 우리나라 남자 평균수명이 75세인데 그 정도면 살 만큼 산 것이니 99세까지 바라는 것은 욕심이자 사치이므로 88세까지만 살자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 오래 살면 자식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만큼 하늘이 정해준 명에 따라 건강하게 살다 조용히 죽자는 뜻이다.
그러나 인명이 제천이기에 88세든 99세든 내 맘대로 되는게 아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살든간에 우리의 노인문제, 초고령화 문제가 정말 눈앞에 닥친 심각한 일이라는 거다. 나이 팔순에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배드민턴 치며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복지제도가 돼있다면야 상관 없지만, 90세 바라보는 나이에 골목길에서 끌고 가기도 힘든 리어카에 골판지 박스를 주워 담아 날라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어디 남의 일인가.
초고령화 사회, 우리 포천시내 모든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명(命)88124’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