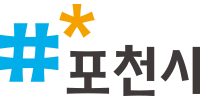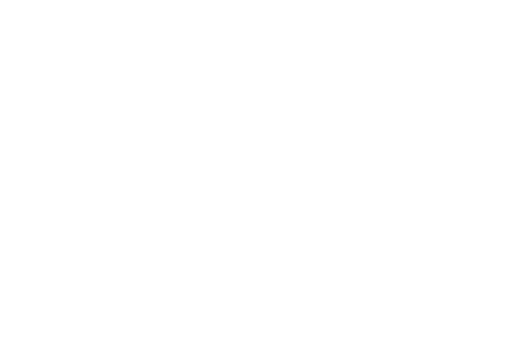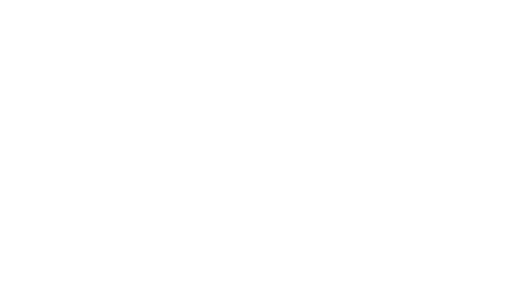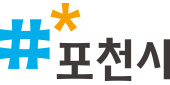어느새, 조용한 천년수 마을의 그 나무 아래에는 샛노란 물이 겹겹이 내려앉았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은행을 주워 양은 대야에 담으시던 할머니는 연신 카메라만 누르고 있던 나에게 작은 소리로 그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의병이셨던 할아버지가 계셨을 때도 이렇게 컸었다고 하시더군. 아마도 이 나무는 천년도 훨씬 넘었을 거야.” 그렇다. 내가 봐도 이 나무는 크기나 풍채로 봐서는 몇 천 년도 더 되어 보인다.
넓은 나무의 둥치를 한 바퀴 돌고나면 마치 거대한 탑돌이를 한 것처럼 괜스레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숙연해진다. 사람에게 흰 머리카락이 나듯이, 우아한 청동 빛을 머금은 8미터의 나무둘레를 보면서 건강하게 나이가 든다는 것이 이렇게 참 멋있는 일이구나. 문득 떠오른다. 그래서 천년수 아래에서 은행을 주우시던 백발노인이 오늘따라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나무 둘레의 보호대에 기대선 젊은이들도 천년수를 바라보며……. ‘우리도 이렇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오랫동안 건강하게 백수(白壽)하게 해 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을까.
가을의 끄트머리, 이른 아침 눈부신 햇살이 내리는 천년수 나무 아래에서 세월을 초월한 자연의 마음을 배워본다.

시민기자 문주희(미학·예술가, stju7st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