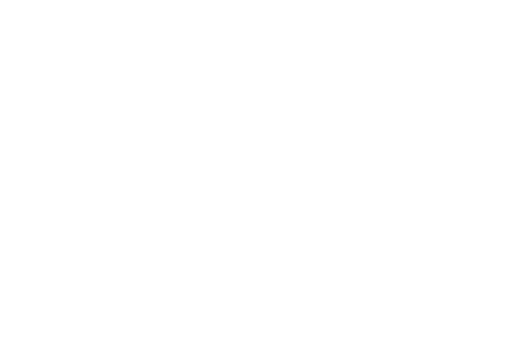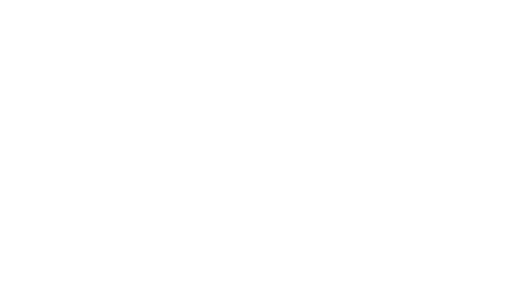주요소식
- 홈
- 시민기자
- 주요소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해에 잠깐 선생님을 뵌 것이 1996년입니다. 대학신입생이던 나는 졸업한 모교를 찾아가서 후배들을 만나고 나오다가 복도에서 선생님을 뵈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갔냐고 물으시면서 앞날에 대한 선생님의 간단한 언급을 듣고, 선생님 당신의 대학시절 이야기를 정말이지 잠깐 들었습니다. 아마 시간으로 치면 5분이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생님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해 저는 유난히 추운 겨울에 선생님을 뵈러 일동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우연히 선생님께서 다니시는 교회가 일동으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저에게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알려 준 곳은 일동면 화대리의 한 펜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펜션을 함께 운영한다는 것이었죠. 일동은 자주 가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포천시이니까 집에서 차로 50여분을 달려가야 하지만 하나도 멀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는 동안 나는 '무슨 말을 어떻게 먼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의 시작처럼 안부를 묻고, 건강을 묻고, 하는 일을 묻고 뭐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 없는 대화를 하는 시간조차 부질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보고 싶었노라고 하고 싶어졌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선생님은 내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1997년에 전교조 결성과 관련하여 학교를 떠나셨습니다. 학교에서 강제로 퇴직을 당하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선생님을 지키겠다고 학교로 몰려갔을 때 이미 경찰들이 학교 정문을 막고 졸업생들은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었고, 재학생 후배들이 연일 시위로 선생님을 지키던 80년 흔히 볼 수 있는 저항의 한 장면이 연출되는 그 시기에 선생님은 우리 곁에서 멀어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드린 선생님을 옥고를 치루고 오시면 꼭 은사님으로 제대로 한번 모셔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 무심한 세월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육감적인 세속에 물들어 나는 그만 선생님을 까맣게 잊고 지냈던 것입니다.

어느 덧 차는 47번 국도에서 내려 화대리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큰 길들은 눈이 다 녹았지만 이곳은 아직 한겨울의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들이 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좁은 길을 따라 덜컹거리면서 차가 들어갔습니다. 무척 추운 날씨 탓에 오히려 차바퀴는 미끄러지지 않고 맨 길인 것처럼 잘 나갔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을 잊고 있던 2000년 경 나는 우연히 고등학교 선배 한 사람과 같은 사업을 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배의 결혼식 주례를 바로 오늘 만나려는 선생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배는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 너도 한 번 연락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생각은 정말 굴뚝같았지만 왠지 그 때 나는 좀 더 세상적으로 성공한 다음에 선생님께 화려한 모습으로 찾아뵈어야지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옹졸하고 속 좁은 생각입니다만 그 때는 장사를 하면서 매일 ‘돈, 돈’ 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시절이라 나도 모르게 그만 세상 사는 기준을 그렇게 판단하는 우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세월이 오래 갔는데 먼저 한 번은 뵙고, 후일 성공한 뒤에 화려하게 찾아뵈어야 하는 것이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내 모습을 왠지 선생님께서 더 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정말로 단순한 생각으로 그만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드디어 차는 선생님께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저 작은 건물이 바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였습니다. 서울 태릉에서 빈민선교를 하시던 어느 목사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다니기 시작한 곳이라는 말씀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재개발의 풍랑을 견디지 못하고 멀리 표류하듯 이곳 포천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 모두가 서울 사람들인데도 매주 일동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거리는 멀지만 워낙 47번 국도가 잘 만들어진 까닭에 오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면서 오히려 같은 포천에 있는 내가 더 불편한 것 아니냐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다른 선생님의 제자들과 달리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국어를 가르치시러 지원을 나온 선생님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6년을 선생님께 배운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로 진학해서는 선생님이 계신 상담실에 들락거렸고, 방송반에서 활동을 한 이유로 학교 축제를 같이 준비하던 문예반을 맡고 계시던 선생님을 행사관계로 자주 찾아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민주노총에서 일하실 때도 그런 학교에서 근무하실 때 모습이 그대로 보이셔서 선생님은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생님을 참 많이도 응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선생님 이제 일흔이 다 되신 거죠?"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이 사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나도 이제 60밖에 안됐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 속으로 이상하다 생각했죠. 제가 처음 만나던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은 꼭 우리 아버지처럼 보였었거든요. 당연히 우리 아버지 연세는 되시지 않았을까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자네 만나던 1980년에 나는 이제 겨우 서른 무렵이었거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환한 미소로 "우리 이제 함께 늙어가는구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럼없이 대해 주시는 은사님을 왜 이제야 찾아 왔을까 하는 회한이 밀려들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 꼭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왜 그렇지 못했나 하는 자책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이유 없이 꼭 선생님이 뵙고 싶으면 이렇게 찾아 뵐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요일, 좀 서두르면서 부산을 떨었지만 그래도 참 마음은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시민기자 이정식(wellth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