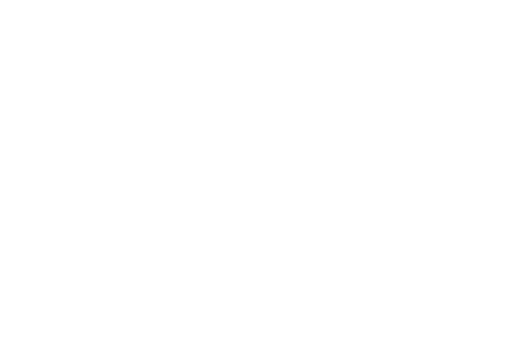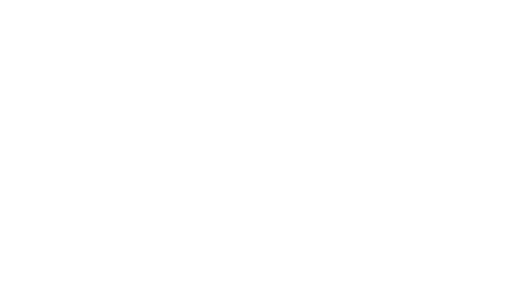시정영상
시민에세이
- 홈
- 참여마당
- 시민에세이
이 봄과 그 봄을 바꿀래?
2014-05-20 조회수 : 5777
윤혜린(관인면)
며칠 전 봄볕을 따라 산책을 나갔다. 집 근처 한탄강을 따라 난 길이었다. 파란 하늘과 무리 지어 나는 새들, 연둣빛 나무와 막 돋기 시작한 풀, 흐르는 강물과 주상절리, 참 고운 봄날이었다. 아기에게 말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 오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몇 분이면 올 수 있어. 우리 참 좋은 데 살지?” 옆에 있는 남편이 지금 참 행복해 보인다며 추임새를 넣었다. 아기가 갑자기 우는 바람에 야외 벤치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웃지 못 할 사건이 있었지만, 그 순간조차 즐거웠다.
문득 얼마 전 부천에 있는 친정에 갔을 때 산책 나간 공원의 풍경이 떠올랐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공원은 모든 것이 꽉 차있었다. 차로 가득한 주차장, 시끄러운 놀이터, 질주하는 자전거, 색색의 장난감이 놓인 가게, 아기는 유모차에 앉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것이 봄이었을까. 봄은 잘 닦인 보도블록 아래로 숨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결혼 전까지 30여년을 살아온 그곳이 생소하기만 했다.
| ||
|
시골 살면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시들시들한 야채를 비싼 값에 사야하고, 먹고 싶은 과일이 있어도 꾹 참아야 한다. 자장면 한 그릇 먹기 위해 차를 타야하고, 세 시간에 한 번씩 다니는 버스에 감사해야 한다. 반면 도시는 편하다. 신선하고 값싼 식재료, 전화 한 통이면 찾아오는 배달 음식, 어디든 가는 버스와 지하철, 그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도시에서 며칠 지낼 때면 나도 모르게 그 편리함에 젖어들곤 한다. “치킨 한 마리요.”라는 전화 한 통으로 저녁 준비가 끝날 때면 “도시 사는 거 참 편하구나.” 부럽기도 하다.
그러나 누군가 내게 “도시에서 사는 거 어때?”라고 묻는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아니요.”이다. 이곳의 봄을 그곳의 봄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도시의 봄은 언제 왔다 가는지 소리 소문 없이 왔다갔다. 삶은 언제나 분주했다. 에어컨에 여름을 잊고 온풍기에 겨울을 잊으며, 언제 꽃이 폈다 지고 또 단풍이 드는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곳의 봄은 다르다. 고운 봄날, 강 따라 난 산책로를 세 가족이 함께 걷는다. 느릿느릿, 걸음을 아낀다. 5월이 연둣빛으로 물들어간다.
※ 본 내용은 무궁무진포천 소식지 제 376호(2014년 5월)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