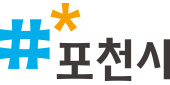문화&관광
- 홈
- 시민기자
- 문화&관광
시민기자 변영숙
겨울 백운산 등반기 - 비록 정상은 오르지 못했지만 행복했던 겨울 산행 겨울 산행 준비 갑자기 겨울 설산이 보고 싶어졌다. 적당한 곳을 물색하다 포천의 백운산으로 결정했다. 그곳에는 아직 며칠 전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있을 것 같았다. 겨울 산행은 무조건 안전이 우선이다. 어느 산행이 안전이 우선하지 않을 리 없지만 겨울 산행에는 예기치 않은 위험이 훨씬 더 많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설산 등산이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면에서 겨울 산행은 더 번거롭다. 준비물이 많다. 등산의 기본 용품인 등산화와 스틱은 기본 중 기본이고, 모자, 장갑, 목도리 등 방한용품 및 아이젠과 스패츠 역시 필수이다. 덧붙이자면 체력 보충을 위해 따뜻한 음료나 물 및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고 바람막이도 여분으로 챙기는 것이 좋다. 용품 준비 면에서 이번 백운산 등산은 100점 기준에 80점 정도인 듯하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드러났다. 스패츠 대신 털 발 토시를 준비했더니 눈이 발목으로 들어가 양말까지 젖었다. 장갑 역시 털장갑이라 금방 축축해졌다. 겨울 용품은 방수 기능이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겨울철 산행에는 체온 조절이 매우 중요해서 두꺼운 옷을 잔뜩 껴입기보다는 적당히 얇은 옷들을 레이아웃으로 몇 겹씩 겹쳐 입는 것이 좋다. 그래야 땀이 나면 벗고, 다시 입고하면서 땀으로 인한 체온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대충 준비물들과 카메라를 챙겨 넣은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배낭을 차에 싣고 백운산으로 향했다. 백운산 등산 출발 백운산은 축석령, 죽엽산, 국사봉, 수원산, 운악산, 청계산, 국망봉, 백운산, 광덕산으로 이어지는 한북정맥을 이루는 포천의 명산이다. 여름에는 백운산의 맑고 깊은 계곡으로 물놀이 인파가 몰려들고 겨울에는 흥겨운 백운산동장군축제로 계곡이 들썩인다.

@시민기자 변영숙
백운산 등산로 입구 '광덕고개쉼터' 백운산 등산로는 흥룡사 코스와 광덕고개쉼터 코스가 있는데, 이번 산행은 최단 코스인 광덕고개쉼터쪽에서 시작하였다. 보통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이다.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하고 등산로로 들어섰다. 등산로 입구에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산 밖의 도로에는 흔적도 없던 눈이 산속에는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눈이다!.’ 하얀 눈 위로 누군가의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벌써 이곳을 다녀갔구나…’ 생각하면서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바닥에 돌이 있는지, 바닥이 패였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푹신푹신한 하얀 솜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아이젠까지 찬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하늘 위를 떠도는 하얀 구름처럼 가벼웠다. 무심코 디딘 발이 늪에 빠지듯 눈 속에 푹 빠질 때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가도 발밑에서 뽀드득 소리가 들리면 더할 나위 없는 상쾌함을 느꼈다. 모자의 촘촘한 섬유조직을 뚫고 들어오는 칼바람에 뒤통수가 서늘했지만 행복한 기분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바람에 쌓였던 눈이 떡가루처럼 공기 중으로 하얗게 휘날렸다.

@시민기자 변영숙
백운산 등산로에 발이 푹푹 빠지도록 수북하게 눈이 쌓여 있다. 오직 앞만 보고 걸었다. 백운산 등산로 전반부는 오르막 내리막도 없이 비교적 평이한 능선을 따라 걷는 길이었다. 이따금 안전 루프가 설치된 급격한 경사 구간이 있었지만 그렇게 험하지는 않았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방공호는 이곳이 군사적 요충지였요, 접경지임을 새삼 각인시켜 주었다. 한 시간 정도 눈 덮인 산속 오솔길을 걸었다. 작은 쉼터가 나왔다. 안내판과 나무 의자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옆에는 방공호가 보였다. 처음으로 살짝 조망이 터진 곳이다. 사방을 에어 싼 겨울 설산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상록수와 침엽수 그리고 ‘눈’이 만들어 낸 ‘패턴’이 한 폭의 수묵화 같다. 맞은편 광덕산 쪽으로 조경철 천문대도 보였다.

@시민기자 변영숙
백운산에서 바라본 광덕산 조경철천문대 능선을 기준으로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화천으로 나뉜다. 강원과 경기의 관문이다. 계곡을 따라 화천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백사처럼 구불거리며 뻗어나가고 있었다.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드는 길이었다. 오랜 전 많은 장사치들이 쌀과 소금과 생선을 지고 오갔을 수도 있고 전시에는 군용 트럭과 탱크가 지나는 길이었을지도 모른다. 음료와 비스킷을 먹으며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숲길을 걸었다. 눈앞에 늘씬하게 빠진 전나무들의 집단 서식하는 전나무 숲이 나타났다. 능선을 기준으로 숲도 완전히 달랐다. 이쪽은 전나무 숲이고, 반대쪽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나무들이 무성했다. 거리상으로는 1m도 안 되는데 서식하는 나무들이 이렇게 다르다니! 숲에는 자연의 신비로움이 그득했다.

@시민기자 변영숙
눈이 그린 설화 이제 백운산까지 1.7km 남짓 남았다. 어림잡아도 내 걸음으로 2시간은 더 걸릴 거리다. 짧은 겨울 해를 생각하면정상까지 다녀오는 것은 무리였다. 바람도 훨씬 거세지고 기온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아쉽지만 하산을 결정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정상은 제일 꼭대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나의 최대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정상이 아닐까. 나는 오늘 나의 ‘정상’에 다녀온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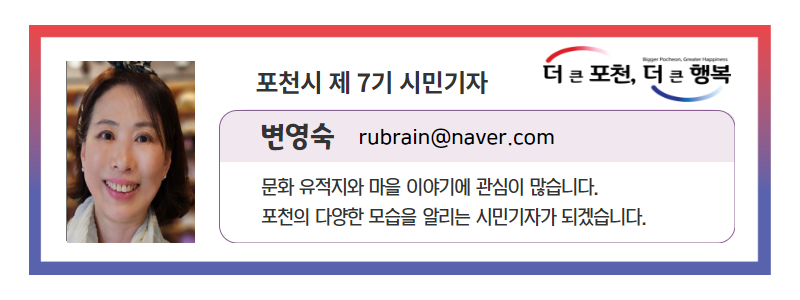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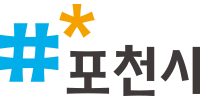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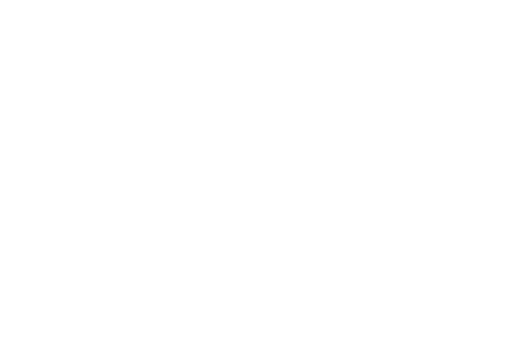
![[KBS Life] 재난안전119 포천시 재난안전 대비 / 2025.7.2.](/images/newshome/2020/img_blank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