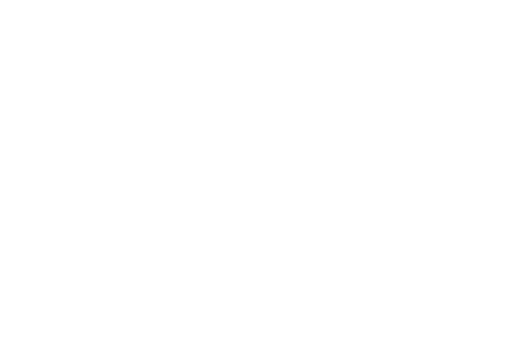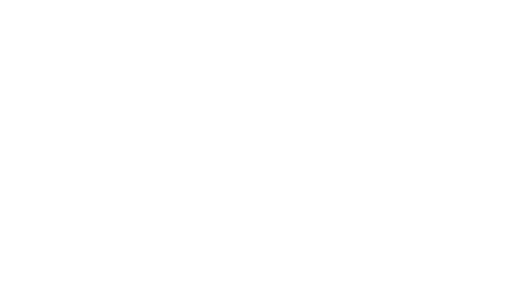핫이슈
시정영상
시민에세이
- 홈
- 참여마당
- 시민에세이
내 고향 일동면 기산리를 그리며
2011-07-05 조회수 : 4651
(김덕용, 설운동)

ⓒ포천시
나의 고향은 일동면 기산리의 조그만 마을이다. 완만한 산비탈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는 논배미가 손바닥만 했으며 가파른 비탈에는 제법 큰 밭뙈기들이 걸쳐져 있는 작은 농촌 마을이다.
70년대에 다니던 초등학교 뒤에는 높은 산이 딱 버티고 있었고 왼쪽은 골짜기의 상류가 있었다. 냇물 흐르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소낙비 떨어지는 소리로 착각할 만큼 귓전을 맴돌았다.추억을 되새겨 보면 아직 지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서려 있는 그 모습과 느낌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더욱 안타깝다.
초등학교까지는 집에서 꽤나 떨어진 먼 거리였지만 불평 없이 걸어서 6년을 개근하였으니 지금 생각해도 대견하다. 점심은 보리밥 한 그릇이지만 그 보리밥조차 못 싸고 개떡 두 개 싸온 친구와 그것을 나누어먹던 우정, 귀갓길에는 뱃가죽이 허리에 닿을 정도로 배가 고팠기에 때로는 길옆 밭에 왜무 쑥 뽑아 껍데기 벗겨내고 신나게 요기를 하기도 하였고, 어떤 날은 책보는 허리에 두른 채 논에 뿌려놓은 거름더미 옆에 우르르 달려 붙어 있는 논우렁이를 잡아 생채로 몇 마리 씹어 먹으면 금세 배가 불렀다.
여름이면 콩청태, 밀청태 구워 손바닥에 비벼먹던 추억이며 큰아기 젖꼭지 같은 통통 익은 빨간 산딸기 따먹던 정서와 낭만은 잊을 수가 없다. 학교에서 오다가 옷 벗어던지고 냇가에서 헤엄치며 멱 감고 놀다가 모래무지와 미꾸라지, 구구락지며 붕어와 가물치, 메기 잡아 마른풀 뜯어 불을 놓고 구어 먹던 추억이며, 논 갈아엎은 쟁기밥에서 싹 틔우는 콩털만한 올미는 달콤하고도 고소하여 글 쓰는 지금도 목젖이 달궈짐을 금할 수 없다.
그런 추억들이 아득하게 멀어져 가는데 그나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가보지도 못하니 항상 마음속에서만 죄스러울 뿐이다. 보리밥에 늘 배고팠지만 그래도 애잔하게 그립고, 꿈의 보금자리였던 그곳이 잔영으로 남아 가슴에 메아리친다.
하지만 요즘 곳곳에서 아이들이 줄어들어 초등학교가 폐교될 거라는 소식, 또는 어디선가는 아예 폐교가 되어 그곳이 양로원으로 바뀔 거라는 소식이 들리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농민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고 그나마 남아 계신 분들은 노인들뿐이라 학생들이 아예 없기 때문이란다.
내 추억의 편린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곧 시간을 내어 어린 시절 꿈의 궁전을 다시금 한번 돌아보고, 짬을 내어 찾아보리라.